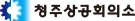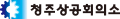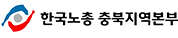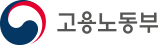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AI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스마트폰에서 회의록을 대신 정리해주고, 고객센터에서는 챗봇이 먼저 상담을 시작하며, 회사는 자동화 시스템이 생산 일정을 조정한다.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실험단계를 거쳐 천천히 확산되었지만, AI는 이 과정을 거의 생략한 채 삶과 일 전체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직업은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특히 일자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 문서 정리, 데이터 입력, 단순 보고서 작성처럼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처리한다. 반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는 역량은 새롭게 요구된다. 이렇게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노동시장에서는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생겨난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존보다 경쟁력이 낮아지는 흐름이다.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기술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적응 속도 차이’에 가깝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직이라도 한 사람은 AI를 활용해 보고서 초안을 10분 만에 만들지만,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작성해야 한다. 같은 현장직이라도 한 사람은 AI 기반 장비를 다룰 줄 알아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기존 방식에 머무르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AI 활용 능력은 임금, 업무 범위, 승진 기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기술 격차가 곧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업훈련은 더 이상 ‘기술을 하나 배우는 과정’이 아니다.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즉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한 직무를 10년, 20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직무를 옮겨 다니며 자신의 역할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대로 변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업훈련의 방향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짧고 민첩한 학습이 필요하다. 몇 달씩 교육받기 어려운 재직자에게는 짧은 모듈형 교육이 더 적합하다. 둘째,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학습이어야 한다. 단순 이론 중심 훈련은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셋째, 모든 직무에서 기본적인 데이터·AI 소양(리터러시)은 필수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제 “AI를 몰라도 되는 직무”보다 “AI를 다루는 능력이 더 큰 경쟁력”이 되는 직무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더 유연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훈련 체계도 민첩하게 따라가야 하고, 재직자들이 시간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AI로 인해 업무가 바뀐 사람들에게는 전환 훈련을 제공해 역량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AI의 확산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변화가 아니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 우리가 일하고 배우는 방식 전체를 재구조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미래의 직업훈련은 기술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일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우고 전환할 수 있는가”에 귀결된다. AI가 빠르게 세상을 바꾼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르게 배우고 적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 충북 역시 지역 산업에 특화된 AI기반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대학-기업을 하나의 AI학습 생태계로 연계함으로써, 변화하는 AI기술에 발 맞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미래 경쟁력은 AI역량을 갖춘 인재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속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체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